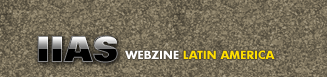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연구교수]
2016년 들어서도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전통적으로 대외경제 취약성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여 ‘경로 의존형(path dependency)’ 발전을 지속해 갈 전망이다. 높은 이자율, 국제시장에서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낮은 수준의 수출상품 가격유지, 통화약세 현상 지속 그리고 낮은 성장률이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경기침체 및 물가 불안정은 특히 몇몇 남미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어 경제위기를 넘어 정치사회적 위기감마저 불러오고 있다(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물론 현재 시점에서 성장률에 대한 전망과 평가는 개별 국가들 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 보듯이, 2012년 등장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회원국들(위로부터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간다는 전망이 있지만 남미의 대국인 브라질과 석유 및 천연가스 에너지 대국인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오히려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남미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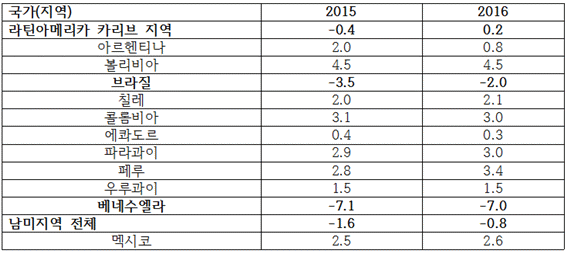
<표>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률 전망 분석: 2015-2016
출처: ECLAC 전망 2015.
많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저성장의 원인이 물론 대외적인 원인들(세계발 금융위기 및 침체 지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거시경제 펀드멘탈의 약점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몇몇 남미 좌파 정부들의 경우 시장 중심적이 아니라 인위적인 국가개입의 정도가 강해서 국제 투자자본의 신뢰를 상실해 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미 좌파들의 등장과 더불어 시장 가격 왜곡을 낳은 국유화, 자본통제, 환율통제 등으로 대변되는 시장의 국가개입 강화가 1차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이들 국가들의 1차 상품 수출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외환보유고를 비우게 만들어 글로벌 경제 침체 국면을 버텨내는 내구력을 상당히 약화시켜 결국 대외경제 취약성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분석이다.1)
UN의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C)의 사무총장 알리시아 바르세나(Alicia Bárcena)의 분석에 의하면, 2016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위와 같은 대뢰 취약성 구조에 복잡한 글로벌 경제 시나리오를 감안해 약 0.2%에 그칠것으로 전망하며, 해외투자 회복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방법으로 2015년 말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적극 참여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전 잠재성이 큰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새로운 투자 유치는 물론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인센티브를 얻ㅇ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특히 공공투자나 사회지출에 대한 과도한 삭감을 피하는 구성으로)을 점검하거나 기존의 방만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 그리고 세금 혜택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에 대한 신규 투자 및 사회복지 지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지역에 만연한 탈세 혹은 조세회피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ECLAC의 부정적인 전망과 2016년 성장률 획복을 위한 경제 개혁 주문 그리고 복잡한 글로벌 경제 변화와 더불어 대외적인 변수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남미와 중국과의 관계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남미 지역의 무역 및 투자(특히 탄화수소 및 광물 부문)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은 이 지역의 경제 성장률에는 또 다른 악재이다. 비록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무역다변화 차원의 대외무역 개방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지만 이는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 태평양 유역의 국가들에 국한되어 있고 대서양 유역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회원국으로 참여 중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는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변동성과 불확실성도해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신흥시장에서 상당한 고전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달러 가치 상승과 금리 인상도 이 지역으로 투자 저조는 물론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점차 달러의존 경제 구조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 경제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물론 위와 같은 대외경제 취약성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하지만 이는 그리 단시일 내에 쉽게 해결하기에는 힘들다. 더불어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외부 변수들(중국의 경기침체, 미국의 달러 및 이자율 변화, 글로벌 차원의 원자재 가격 및 유가하락 등)도 영향을 미치지만 역내 혹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반복되는 대외경제 취약성에 대한 강한 내구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 외부 영향 혹은 충격에 영향을 덜 받는 구조적 차원의 거시경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할수 있다.
물론 성장률 저조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업이 증가하고 빈곤과 사회 불평등의 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다. 경기 침체의 터널을 빠져 나와야 하는 사회소외 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포퓰리즘적 방식보다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빵 만들기 위한 실업 구제 정책이 아니라, 생산적 복지 증대를 위한 빵 만들기 노동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정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투입과 더불어 ‘총요소생산성’ 차원(전문직 종사자 증가 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교육 강화, 과학기술 혁신, 제조업 발전을 위한 산업간 가치사슬 네트워크 확산 등)의 다양한 연관 정책들의 통합적 투입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
자의건 타의건, 혹은 대외적 변수이든 아님 역내 구조적 문제이건 간에, 저성장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과 개혁 논쟁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혹은 가시적 성과를 위한 단기적 경제 처방 혹은 해결 정책보다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오랜 동안 이 지역의 트라우마처럼 반복되어 온 대외경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2016년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과 더불어, 라틴아메리카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동안 반복되어 오던 위기를 단절시키고 ‘장기적 성장(crecimiento de largo plazo)’의 기틀을 만드는 노하우를 찾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
1) http://www.cepal.org/en/pressreleases/latin-american-and-caribbean-economies-will-grow-just-02-2016-complex-global-scenario / http://www.brookings.edu/~/media/Research/Files/Reports/2014/09/latin-america-macroeconomic-outlook-talvi
2)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란 경제 성장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요한 2 생산 요소인 자본과 노동이 행한 기여도를 척도로 분석함에 있어서 이 둘의 기여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들 즉 ‘잔차(residual)’ 부분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혁신을 통한 기술진보(technology advance), 인적자본(human capital) 등과 같은 노동의 질적 개념도 여기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