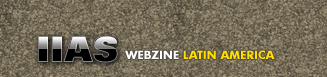서성철(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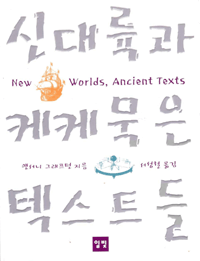 19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과의 만남 50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앤서니 그래프턴이 쓴 '신대륙과 케케묵은 텍스트들(New World, Ancient Texts)' 역시 그 중의 하나다.
19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과의 만남 50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앤서니 그래프턴이 쓴 '신대륙과 케케묵은 텍스트들(New World, Ancient Texts)' 역시 그 중의 하나다.
그래프턴 교수가 이 책에서 일관되게 논의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비유럽 세계, 특히 신대륙을 둘러싸고 유럽 지성계에서 벌어진 지적 전통에 관한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그래프턴 교수는 여러 사료와 고문서·지도·삽화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그런 지적 변화의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고전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 사상의 흐름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닌 이 학자의 책을 통해 우리들은 유럽 사상의 전환기에서 벌어졌던 여러 새로운 현상과 지식을 마주치게 된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정말로 배우게 되는 것은 저자가 언급하는 것처럼 학문이건, 사상이건, 지식이건 간에 새로운 것이나 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새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것의 좋은 예가 바로 신대륙이 발견됨으로써 발생된 고대 텍스트가 가진 경전성의 문제다.
중세의 질곡을 거쳐,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자들의 시대를 거쳐 과학적 사고의 발전, 항해와 발견의 결과로 쏟아져 들어온 새롭고도 놀라운 정보의 유입, 그것을 통한 새로운 학문의 태동, 이성의 진보로 고대의 사유 체계나 지식이 유럽인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의심받던 바로 그 시기, 신대륙의 발견은 유럽의 지식인들에게는 하나의 충격이었다. 이른바 경전이라 불리던 책의 권위가 무너져 가던 시점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대변되는 신대륙의 발견은 다시 한 번 고대의 책들에 그 권위를 실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발견으로 야기된 충격적 사실들은 성경이나 그리스, 로마 고전으로 대변되는 고대 전통의 힘을 더욱 강화시켰던 것이다. 예를 들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인류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다는 성서의 전통적 견해는 신대륙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그 견해에 따르면 신대륙 사람들은 노아의 셋째 아들인 야벳의 후손이다. 어느 포르투갈 신부는 브라질의 한 밀림에서 에덴의 낙원, 또는 에덴의 네 개의 강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어떤 신부는 성 도마가 이미 10세기경 아메리카 대륙에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프턴이 전해주는 이런 예는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는 없다.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의 코믹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경전에 대한 맹목적 신봉은 때때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그것의 최대 피해자는 두말 할 필요 없이 아메리카 인디오들일 것이다.
그러나 학문적인 입장에서 볼 떄 고대의 책들의 부활은 역설적으로 유럽 지성인들이 고대 세계가 이룩한 축적물에 새로운 해석이나 설명을 가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했고, 그 결과 고대의 학자나 저술가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한, 한 마디로 인식의 전환과 학문의 발전이 동시에 이뤄지게 된 것이다. 15세기에서 17세기 서구 유럽에서 벌어진 학문적 논쟁이나 지성사, 정신사 등과 같은 서구 세계의 지적 전통의 변화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책의 주된 내용인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유럽인들이 비유럽세계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왜곡되고 고정된 이미지다. 플리니우스나 헤로도투스를 필두로 해서 마르코 폴로나 맨드빌의 황당무계한 이야기에서 보듯, 유럽인들에게 미지의 지역은 한마디로 유럽인들이 만들어 낸 상상력의 산물이었다. 어떤 때 그곳은 이상향이자 낙원이 되고, 그러다가는 착취의 대상물로 바뀐다. 개의 머리를 한 인간이나 발이 너무 커 그것으로 햇빛을 가린다는 외발 괴물족의 이야기는 차라리 즐겁고 애교스럽다. 그러나 황금으로 범벅이 된 엘도라도 신화의 탄생은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 양적 개념을 발전시킨 유럽인들이 제국주의로 나가게 되는 훌륭한 동기가 된다. 물론 그 뿌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전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적 속에 등장하는 비유럽 변방세계에 대한 기술은 철저히 유럽 중심주의에 입각해 있다. 물론 저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피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은 저자의 흠이 될 수는 결코 없다. 어차피 판단은 우리의 몫이니 우리는 그저 신대륙과의 만남을 둘러싸고 야기된 기존의 경전이나 텍스트의 논란에 대해 그가 전해주는 놀라운 정보만으로도 족하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대륙의 발견을 둘러싸고 벌어진 수많은 모순 덩어리들, 그리고 그것들을 양산해 낸 학자들이나 사상가들 역시 바로 그 시대의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지중해 너머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빠져 나가서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고자 했던 콜럼버스를 비롯한 수많은 탐험가들이나 상인들, 학자, 철학자들은 고전의 내용을 신봉하여 경전이라는 텍스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학문의 '위대한 재건'을 표방하면서 기존의 권위를 우상으로 간주해 파괴하자고 부르짖은 베이컨이나 홉스 역시 이런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지나간 시대의 죽은 전통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악몽처럼 짓누른다"는 마르크스의 말은 권위와 억압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지만 바로 이렇게 말한 마르크스 자신이, 또는 그의 저작물이 바로 권위 그 자체, 또는 경전이 된 적이 있다.
사실 정치나 종교에서 경전에 빠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또 그 권위에 의존하는 현상은 여전하다. 경전의 문제점은 언제나 그것이 독단으로 흐르고, 타자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거나 봉쇄할 때 생긴다. 그것이 도그마가 될 때 남는 것은 독백과 권위, 유·무형의 폭력과 억압밖에 없다. 그런 현상은 반드시 서구 세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도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하고 억누르는 수만 가지 숨막히는 일이 권위의 이름으로 도처에서 횡행하고 있다.
15세기에서 17세기, 아니 지금까지도 서구 사회에서 성서나 그리스 고전들은 하나의 신성 불가침한 진리로 어느 특수한 계층이나 집단의 독점물이었다. 우리들은 그런 경전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이 불가능할 때 우리 인류사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초래됐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경전성에 해방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전의 모든 신비로움을 벗겨 버리고 경전을 텍스트 그 자체로 읽는 일일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경전의 권위와 몰락, 그리고 부활을 다루고 있는 앤서니 그래프턴 교수의 '신대륙과 케케묵은 텍스트들'은 좋은 텍스트가 될 것이다.